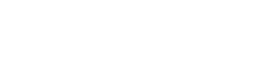칼럼 [이만열 칼럼] 예언자의 외침과 고종석의 절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02-26 16:09 / 조회 2,806 / 댓글 0본문
예언자의 외침과 고종석의 절필
이만열 교수, "'선지자적 비관' 안고 여전히 외치는 예언자 본받아야"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개혁연대 고문
지난 몇 주간 페이스북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유가 있다. 새해 들어, 올 계사년에는 60년 전 계사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했고, 이젠 종북(從北)이란 용어를 끝내고 공북(共北)과 화북(和北)으로 나서자는 주장을 폈던 뒤끝이라, 북한의 핵실험은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먼저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해, 우리 시대에 가장 양심적인 글을 써 왔던 고종석이 왜 절필(絶筆)을 선언하고 글쓰기를 그만 두었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글을 좋아했던 나로서는 당시 의아심을 가졌고 충격도 받았다. 그의 절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글을 써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런 점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나 신약의 바울이 같이 외쳤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롬10:16)고 하는 심경과도 통한다고 본다. 글이나 외침이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누구나 절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꼭 글만 그러하겠는가.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외치는 것도 그럴 것이다.
구약 예언자들의 외침은 거기에 호응하여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외치는 것을 중지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대적·역사적 소명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그 예언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시대적 소명 앞에서 심지어는 수난을 당하면서까지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외쳐도 효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내 친구 손봉호는 '선지자적 비관'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선지자적 비관'을 안고서도 시대적 사명인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던 예언자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그마한 시련도 인내하지 못했던 나약한 자신을 겨우 수습해 가고 있다.
어제는 두 교회에서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새맘교회(박득훈 목사)에서 '한국교회 성장과 성경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처음 접촉하게 되는 데서 시작하여 선교사 내한에 앞서 성경을 번역, 보급함으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성경 보급에 헌신한 권서들에 대한 이야기와, 주로 겨울철에 모인 사경회의 열심도 소개했다.
1901년 평양에서 모인 여성 사경회에는 사경회 기간 동안 사용할 양식과 옷가지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삭주·창성 지방에서 300리 길을 걸어온 여성들이 있었다. 1902년, 400여 명이 모인 평양의 '사나이'사경회에는 전라도 목포 무안 지방에서 참석한 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 대목을 소개할 때마다, 1971년 이 자료를 발견했을 때 눈물을 흘린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 선교사들은, 1909년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온 한 자매를 소개했고,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업고 온 다른 자매들의 손에는 손때 묻고 닳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게 초대 한국교회가 성경을 통해 성장하던 모습이었다. 이 설교는 새맘교회 카페(바로 보기 : 이만열 교수 설교 영상)를 통해 볼 수 있다.
어제 오후에는 내가 섬기는 하나로교회에서 '3.1운동과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북한에서 옮겨온 젊은이들이어서 역사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아 3.1운동사부터 차분히 설명해 갔다. 평양 혁명박물관의 한 면 벽에 초라하게 소개되어 있는 3.1운동의 역사를 끄집어내어 그것이 한민족사와 세계사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운동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설명했다.
다음 주 3월 4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7:00-8:30)마다 8회에 걸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양화진문화원 공동으로 이만열을 강사로 하여 '해방 이후 한국교회사'를 강의한다. 02)2226-0850, 02)324-0857와 홈페이지 www.ikch.org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교재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 : 해방 이후 20세기 말까지>(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사용한다.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61
이만열 교수, "'선지자적 비관' 안고 여전히 외치는 예언자 본받아야"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개혁연대 고문
지난 몇 주간 페이스북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유가 있다. 새해 들어, 올 계사년에는 60년 전 계사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했고, 이젠 종북(從北)이란 용어를 끝내고 공북(共北)과 화북(和北)으로 나서자는 주장을 폈던 뒤끝이라, 북한의 핵실험은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먼저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해, 우리 시대에 가장 양심적인 글을 써 왔던 고종석이 왜 절필(絶筆)을 선언하고 글쓰기를 그만 두었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글을 좋아했던 나로서는 당시 의아심을 가졌고 충격도 받았다. 그의 절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글을 써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런 점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나 신약의 바울이 같이 외쳤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롬10:16)고 하는 심경과도 통한다고 본다. 글이나 외침이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누구나 절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꼭 글만 그러하겠는가.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외치는 것도 그럴 것이다.
구약 예언자들의 외침은 거기에 호응하여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외치는 것을 중지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대적·역사적 소명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그 예언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시대적 소명 앞에서 심지어는 수난을 당하면서까지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외쳐도 효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내 친구 손봉호는 '선지자적 비관'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선지자적 비관'을 안고서도 시대적 사명인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던 예언자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그마한 시련도 인내하지 못했던 나약한 자신을 겨우 수습해 가고 있다.
어제는 두 교회에서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새맘교회(박득훈 목사)에서 '한국교회 성장과 성경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처음 접촉하게 되는 데서 시작하여 선교사 내한에 앞서 성경을 번역, 보급함으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성경 보급에 헌신한 권서들에 대한 이야기와, 주로 겨울철에 모인 사경회의 열심도 소개했다.
1901년 평양에서 모인 여성 사경회에는 사경회 기간 동안 사용할 양식과 옷가지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삭주·창성 지방에서 300리 길을 걸어온 여성들이 있었다. 1902년, 400여 명이 모인 평양의 '사나이'사경회에는 전라도 목포 무안 지방에서 참석한 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 대목을 소개할 때마다, 1971년 이 자료를 발견했을 때 눈물을 흘린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 선교사들은, 1909년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온 한 자매를 소개했고,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업고 온 다른 자매들의 손에는 손때 묻고 닳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게 초대 한국교회가 성경을 통해 성장하던 모습이었다. 이 설교는 새맘교회 카페(바로 보기 : 이만열 교수 설교 영상)를 통해 볼 수 있다.
어제 오후에는 내가 섬기는 하나로교회에서 '3.1운동과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북한에서 옮겨온 젊은이들이어서 역사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아 3.1운동사부터 차분히 설명해 갔다. 평양 혁명박물관의 한 면 벽에 초라하게 소개되어 있는 3.1운동의 역사를 끄집어내어 그것이 한민족사와 세계사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운동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설명했다.
다음 주 3월 4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7:00-8:30)마다 8회에 걸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양화진문화원 공동으로 이만열을 강사로 하여 '해방 이후 한국교회사'를 강의한다. 02)2226-0850, 02)324-0857와 홈페이지 www.ikch.org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교재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 : 해방 이후 20세기 말까지>(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사용한다.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