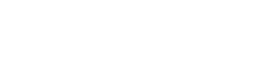칼럼 [이만열 칼럼] 한국교회, 자기 신학이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1-10-26 17:17 / 조회 3,759 / 댓글 0본문
한국교회, 자기 신학이 있는가
복음과상황 [252호] 2011년 09월 29(목) /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8월 중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풀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를 만나 대화하던 중, 풀러신학교가 한국교회에 사과할 문제가 있다면서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풀러신학교가 한국에 알려지기로는 신뢰할 만한 신학교로 알려져 있고, 이 학교에서 공부한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그 신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 한국교회에 사과해야 해야 할 일이 있다니,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날 김세윤 박사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1970,80년대에 풀러신학교가 주장한 ‘교회 성장론’인데, 이는 한국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교회를 물량주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교회 성장론은 성숙 없는 성장을 가져와 교회의 부패로 이어졌고, 성장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의 분열마저 ‘미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맥가브런(Donald McGavran) 교수는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을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준 사례로 들었다. 그가 언급한 대로, ‘교회 성장론’을 통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교회 분열에 대한 죄책은 한국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김 박사가 지적한 것은 1990년대부터 성행한 축사론(逐邪論)과 관련한 것이다. 풀러신학교가 90년대에 귀신론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풀러신학교 안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 김 박사는 ‘On Spiritual Warfare, Generational Curse, and the Like’(영적 전쟁과 저주의 대물림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이를 정리했다.
여기서 필자가 그의 주장 못지않게 흥미를 느낀 것은 그가 축사론을 언급하면서 한국교회가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 대목이다. 축사론을 한국의 어느 목사가 주장할 경우에는 이단으로 몰렸으나 플러신학교의 이론으로 소개하면 이단으로 몰리지도 않고 신학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걸 들으면서 필자는 그가 지적한 ‘사대주의론’이 비단 ‘축사론’에만 해당되겠느냐고 느꼈다. 평소 한국의 신학 풍토를 두고 ‘수입 신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해 온 내게 김 박사의 이런 지적은 순간 다른 의미로 공명을 일으켰다. 김 박사가 언급한 ‘사대주의론’은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말하는 ‘수입 신학론’과 상통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대주의’는 자주성이 없이 강한 세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일컫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거나 강자의 뜻을 비판 없이 답습할 때에도 사용된다.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비하하고 남의 학설이나 논리를 그대로 따를 때도 ‘사대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의 학설이나 사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그 또한 사대주의와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수입 신학’을 아무런 고민이나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사대주의적 발상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김 박사는, 한국의 모 목사가 주장하는 축사론과 풀러신학교의 축사론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도 한국의 것은 이단시되고 풀러신학교의 것은 그런 딱지를 붙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대주의적’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풀러의 것이 미국의 신학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 한국으로서는 기독교를 전파해 준 나라에서 수입된 이론이기 때문에 언감생심(焉敢生心) 그 진위를 따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축사론뿐 아니라 한국의 신학 풍토에서 제법 이론적 틀을 갖춘 신학으로, ‘민중신학’을 제외하고는, 외국으로부터 소개받지 않은 신학이 있느냐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의 신학이 ‘수입 신학’에 불과하다는 필자의 지적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미리 말해 두지만 나는 ‘민중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가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고, 그와 함께 한국교회가 혼탁한 것은 자기 신학을 갖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역설한 바 있다.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학문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점에서는 신학도 마찬가지다. 문제의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문제의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이 학문이다. 상황이란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것도 있으며, 인문적이거나 사회적인 것도 있다. 그런 상황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학문이라는 뜻이다. 신학은 상황 의식과는 무관하다고 우기는 이도 있지만, 칼 바르트의 신학이 1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상황을 토대로,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이 미국의 산업화로 인간이 황폐해 가는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상황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신학도 하나의 학문인 이상 학문하는 방법이 다른 학문과 다르지 않다. 상황을 문제의식으로 승화하여 그것을 성경과 영성에 의해 풀어가는 것이 신학화의 작업이요, 그 결과가 신학이다. 상황과 문제의식이 다르면 그만큼 신학화의 작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학문이 다양하듯이 신학도 그럴 수 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신학이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혹은 시대적으로 개성을 가진 특수한 성격의 신학이 그런 특수성에 머물러 있게 되면 보편성에 입각한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가 힘들다. 개성적이고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지역 한 시대에 특수한 성격을 띠고 나타난 학문이 시공(時空)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한 시대 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이 학문적으로 성숙하려면 반드시 보편화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신학이 ‘수입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고민을 통해 성립된 신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가 첫 세례자를 낸(1785) 지 230년이 되어 가고 개신교도 첫 세례자가 나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의 신학’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니 신라에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527)로부터 원효(元曉, 617~686)가 나타난 것은 100년이 채 안된 시기이며, 그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등 100여 종의 저술로 동양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불교가 공인된 지 140년이 되기 전이다. 소통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뒤졌던 그 시기에 원효같은 이가 그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교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일찍부터 신학화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지적․종교적 풍토에 전래된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는 문제를 두고 소위 토착화를 위한 신학적 시도가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보수성이 강했던 선교사들의 신학적 지향성이 이를 막아 버렸다. 그 뒤 윤성범, 유동식, 변선환 교수의 신학화 작업이 빛을 보는 듯했으나 충분히 맥을 잇지 못했다. 군사정권과 유신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태동한 ‘민중신학(Minjung Theology)’은 해외에까지 한국 신학으로 널리 소개되었으나 너무 일찍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 이런 신학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 해외에 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이들이 한국에서 자기의 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내거나 혹은 강단에서 제대로 강의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신학교의 지적 실정이다. 새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옛것만 답습하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신학의 길은 막혀 버렸다. 학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 비판의 가능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학자들의 학문의 자유와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상황은 교회의 이상한 신앙 행태만 자라게 한다. 신학적으로 제대로 비판을 받지 못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어쩌면 신학 없는 교회들의 비복음적 신앙이 역으로 신학교의 교육을 폐쇄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신학화’의 가능성을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한국교회는 자기 신학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성경 연구와 서양신학, 서양교회사 못지않게 신학교에서 동양과 한국의 고전을 읽혀야 한다. 종자(씨)에 대한 연구와 교육 못지않게 이 땅과 밭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땅과 밭에 대한 연구는 이 땅의 인문‧사회‧예술적인 풍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땅의 사상적 풍토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한국교회가 자기 신학을 가질 수 없다. 한국 신학교들은 교육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현장 없는 공허한 설교가 계속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학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해 가고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자기 신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세계 선교 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에 비해서 종교적 영성은 고사하고 윤리적‧도덕적 영향력마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세계적 바울 신학자로 알려진 김세윤 박사는 한국교회의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 또는 신학의 왜곡과 천박성을 그 첫째로 꼽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 덧붙여 한국교회가 신학화에 대한 고민과 진통을 제대로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 ‘토착화’를 고민할 때에는 타 종교와의 유사성과 상이점에 천착하여 그리스도교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없는 지금은 ‘복음의 샤머니즘화’가 광신적으로 진전되고 있어도 이를 분간할 영성과 지성을 다 잃어 버렸다. 군사독재 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산고를 겪은 민중신학은 연약한 ‘민중’을 자각시켜 하나님의 정의, 사랑, 생명, 평화를 확인하고 실천, 투쟁토록 했지만, 장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사회에 교회가 아편중독에 걸린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어도 이제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남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듯이, 수입신학 가지고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영성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 무수한 신자들이 있음에도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자기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우리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 한국교회도 자기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학문 외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교회에 기여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언제까지 남이 제공해 주는 ‘우유 신학’, ‘수입 신학’에 머물러야 하는가. 복상 독자들도 이제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9
복음과상황 [252호] 2011년 09월 29(목) /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8월 중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풀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를 만나 대화하던 중, 풀러신학교가 한국교회에 사과할 문제가 있다면서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풀러신학교가 한국에 알려지기로는 신뢰할 만한 신학교로 알려져 있고, 이 학교에서 공부한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그 신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 한국교회에 사과해야 해야 할 일이 있다니,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날 김세윤 박사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1970,80년대에 풀러신학교가 주장한 ‘교회 성장론’인데, 이는 한국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교회를 물량주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교회 성장론은 성숙 없는 성장을 가져와 교회의 부패로 이어졌고, 성장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의 분열마저 ‘미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맥가브런(Donald McGavran) 교수는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을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준 사례로 들었다. 그가 언급한 대로, ‘교회 성장론’을 통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교회 분열에 대한 죄책은 한국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김 박사가 지적한 것은 1990년대부터 성행한 축사론(逐邪論)과 관련한 것이다. 풀러신학교가 90년대에 귀신론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풀러신학교 안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 김 박사는 ‘On Spiritual Warfare, Generational Curse, and the Like’(영적 전쟁과 저주의 대물림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이를 정리했다.
여기서 필자가 그의 주장 못지않게 흥미를 느낀 것은 그가 축사론을 언급하면서 한국교회가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 대목이다. 축사론을 한국의 어느 목사가 주장할 경우에는 이단으로 몰렸으나 플러신학교의 이론으로 소개하면 이단으로 몰리지도 않고 신학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걸 들으면서 필자는 그가 지적한 ‘사대주의론’이 비단 ‘축사론’에만 해당되겠느냐고 느꼈다. 평소 한국의 신학 풍토를 두고 ‘수입 신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해 온 내게 김 박사의 이런 지적은 순간 다른 의미로 공명을 일으켰다. 김 박사가 언급한 ‘사대주의론’은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말하는 ‘수입 신학론’과 상통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대주의’는 자주성이 없이 강한 세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일컫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거나 강자의 뜻을 비판 없이 답습할 때에도 사용된다.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비하하고 남의 학설이나 논리를 그대로 따를 때도 ‘사대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의 학설이나 사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그 또한 사대주의와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수입 신학’을 아무런 고민이나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사대주의적 발상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김 박사는, 한국의 모 목사가 주장하는 축사론과 풀러신학교의 축사론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도 한국의 것은 이단시되고 풀러신학교의 것은 그런 딱지를 붙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대주의적’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풀러의 것이 미국의 신학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 한국으로서는 기독교를 전파해 준 나라에서 수입된 이론이기 때문에 언감생심(焉敢生心) 그 진위를 따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축사론뿐 아니라 한국의 신학 풍토에서 제법 이론적 틀을 갖춘 신학으로, ‘민중신학’을 제외하고는, 외국으로부터 소개받지 않은 신학이 있느냐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의 신학이 ‘수입 신학’에 불과하다는 필자의 지적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미리 말해 두지만 나는 ‘민중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가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고, 그와 함께 한국교회가 혼탁한 것은 자기 신학을 갖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역설한 바 있다.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학문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점에서는 신학도 마찬가지다. 문제의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문제의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이 학문이다. 상황이란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것도 있으며, 인문적이거나 사회적인 것도 있다. 그런 상황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학문이라는 뜻이다. 신학은 상황 의식과는 무관하다고 우기는 이도 있지만, 칼 바르트의 신학이 1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상황을 토대로,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이 미국의 산업화로 인간이 황폐해 가는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상황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신학도 하나의 학문인 이상 학문하는 방법이 다른 학문과 다르지 않다. 상황을 문제의식으로 승화하여 그것을 성경과 영성에 의해 풀어가는 것이 신학화의 작업이요, 그 결과가 신학이다. 상황과 문제의식이 다르면 그만큼 신학화의 작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학문이 다양하듯이 신학도 그럴 수 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신학이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혹은 시대적으로 개성을 가진 특수한 성격의 신학이 그런 특수성에 머물러 있게 되면 보편성에 입각한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가 힘들다. 개성적이고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지역 한 시대에 특수한 성격을 띠고 나타난 학문이 시공(時空)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한 시대 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이 학문적으로 성숙하려면 반드시 보편화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신학이 ‘수입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고민을 통해 성립된 신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가 첫 세례자를 낸(1785) 지 230년이 되어 가고 개신교도 첫 세례자가 나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의 신학’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니 신라에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527)로부터 원효(元曉, 617~686)가 나타난 것은 100년이 채 안된 시기이며, 그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등 100여 종의 저술로 동양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불교가 공인된 지 140년이 되기 전이다. 소통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뒤졌던 그 시기에 원효같은 이가 그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교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일찍부터 신학화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지적․종교적 풍토에 전래된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는 문제를 두고 소위 토착화를 위한 신학적 시도가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보수성이 강했던 선교사들의 신학적 지향성이 이를 막아 버렸다. 그 뒤 윤성범, 유동식, 변선환 교수의 신학화 작업이 빛을 보는 듯했으나 충분히 맥을 잇지 못했다. 군사정권과 유신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태동한 ‘민중신학(Minjung Theology)’은 해외에까지 한국 신학으로 널리 소개되었으나 너무 일찍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 이런 신학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 해외에 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이들이 한국에서 자기의 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내거나 혹은 강단에서 제대로 강의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신학교의 지적 실정이다. 새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옛것만 답습하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신학의 길은 막혀 버렸다. 학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 비판의 가능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학자들의 학문의 자유와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상황은 교회의 이상한 신앙 행태만 자라게 한다. 신학적으로 제대로 비판을 받지 못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어쩌면 신학 없는 교회들의 비복음적 신앙이 역으로 신학교의 교육을 폐쇄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신학화’의 가능성을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한국교회는 자기 신학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성경 연구와 서양신학, 서양교회사 못지않게 신학교에서 동양과 한국의 고전을 읽혀야 한다. 종자(씨)에 대한 연구와 교육 못지않게 이 땅과 밭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땅과 밭에 대한 연구는 이 땅의 인문‧사회‧예술적인 풍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땅의 사상적 풍토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한국교회가 자기 신학을 가질 수 없다. 한국 신학교들은 교육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현장 없는 공허한 설교가 계속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학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해 가고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자기 신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세계 선교 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에 비해서 종교적 영성은 고사하고 윤리적‧도덕적 영향력마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세계적 바울 신학자로 알려진 김세윤 박사는 한국교회의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 또는 신학의 왜곡과 천박성을 그 첫째로 꼽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 덧붙여 한국교회가 신학화에 대한 고민과 진통을 제대로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 ‘토착화’를 고민할 때에는 타 종교와의 유사성과 상이점에 천착하여 그리스도교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없는 지금은 ‘복음의 샤머니즘화’가 광신적으로 진전되고 있어도 이를 분간할 영성과 지성을 다 잃어 버렸다. 군사독재 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산고를 겪은 민중신학은 연약한 ‘민중’을 자각시켜 하나님의 정의, 사랑, 생명, 평화를 확인하고 실천, 투쟁토록 했지만, 장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사회에 교회가 아편중독에 걸린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어도 이제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남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듯이, 수입신학 가지고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영성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 무수한 신자들이 있음에도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자기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우리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 한국교회도 자기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학문 외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교회에 기여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언제까지 남이 제공해 주는 ‘우유 신학’, ‘수입 신학’에 머물러야 하는가. 복상 독자들도 이제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9